스웨덴에서 화합물반도체 기술 연구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는 임장권 박사의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과제를 심도 있게 되짚어보게 한다. 그는 스웨덴국립연구원(RISE)에서 17년 동안 WBG(고에너지 밴드갭) 전력반도체 분야에 몰두하며, 그 과정에서 스웨덴의 협업 생태계를 경험하고 있다. 임 박사는 조선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한 후 LG마이크론에서 근무하며 해외 유학의 기회를 얻어 스웨덴으로 건너갔다. 그의 연구 여정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스웨덴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화합물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소재 연구에 편중된 반면, 스웨덴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기업, 대학, 연구소가 협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임 박사는 RISE의 전력전자 측정 연구실에서 WBG 전략 연구를 이끌며, 스웨덴의 3500명 연구 인력과 130여 개의 테스트베드를 활용하여 실용적 연구 그리고 기술 이전에 힘쓰고 있다. 스웨덴의 전력반도체 산업은 세계적인 기업인 볼보와 ABB 등과의 협력을 통해 WBG 소재의 상용화를 이끌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배워야 할 점이다.
한국의 산업 환경은 제조업 기반으로 튼튼하지만, 연구 접근 방식은 과제 중심으로 단기 성과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임 박사는 이러한 한국의 연구 환경이 중복 과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기존 기술의 고도화보다는 새로운 과제를 추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력반도체에 대한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빠른 트렌드 적응력과 우수한 젊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스웨덴의 연구 생태계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기반으로 하여 산업, 학계, 공공부문이 함께 협력하고 있다. 임 박사는 RISE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환경이 연구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스웨덴은 기업과 연구소가 같은 공간에서 연구하며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채택해야 할 모델로 보인다. 연구기관과 기업의 협력이 실질적인 연구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
임 박사는 또한 화합물반도체 시장의 산업적 중요성을 설명하며, 현재 유럽에서 이 분야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과잉 공급과 구조 재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EU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장기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도 이러한 글로벌 흐름을 반영하여 화합물반도체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임 박사는 한국의 화합물반도체 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산업형 인재 양성을 꼽는다. 그는 산업현장에서의 경험을 쌓은 전문가를 교수진으로 영입하고, 산학협력 중심의 연구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연구와 산업화를 연결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상업화 목표를 재고하고,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기술 성숙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 박사는 한국의 화합물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시·도별 중복 투자를 지양하고 효율적인 연구 인프라 공유와 전략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때, 한국 화합물반도체 산업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의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한국도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62/0000018822?sid=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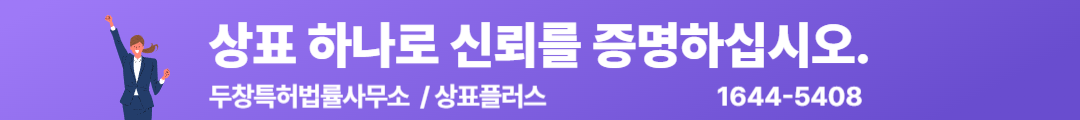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