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바이오 신약 벤처기업들의 특허 관리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투셀 사태가 발생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특허 관리 관행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바이오 업계가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허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사건은 지난 9일, 신약 개발사 인투셀과 에이비엘바이오 간의 기술 이전 계약 해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에이비엘바이오가 인투셀에서 도입한 항체약물접합체(ADC) 기술이 중국 바이오기업의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ADC 분야는 차세대 항암제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인투셀의 핵심 기술이 특허 논란에 휘말리면서 바이오 업계와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잠수함 특허’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업계에서는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물질 특허나 용도 특허를 출원하면 사실상 특허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해왔습니다. 그러나 특허 출원 사실이 일반적으로 18개월 후에 공개되기 때문에, 유사한 특허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인투셀 사태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인투셀은 이제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특허 분쟁에 휘말리거나 해당 특허 기술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투셀의 ADC 기술을 기반으로 신약을 개발 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차질을 겪게 되었습니다. K바이오의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제2의 인투셀 사태가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ADC와 세포·유전자 치료제 분야에서 중국의 빠른 성장 속도를 고려할 때, 잠수함 특허 이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계기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전반적인 특허 관리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특허 관리에 소홀하거나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자금난으로 인해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제로 정기적으로 자사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 침해 조사를 실시하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특허 조사를 하더라도 형식적이거나 부실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관리로 인해 임상 단계까지 진행된 후에야 남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로 인해 수백억 원의 연구비가 날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벤처캐피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벤처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도 특허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조사 비용을 아끼려다가 결과적으로 투자 리스크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반면, 글로벌 제약사들은 신약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의 신약 물질이나 기술에 대한 특허 조사에 수억원을 투자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못지않게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64877?sid=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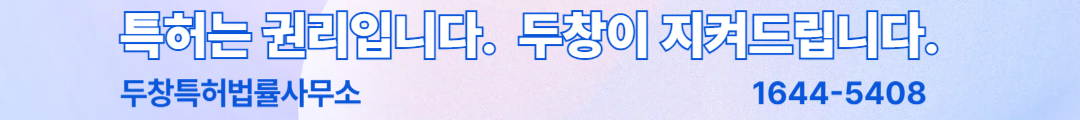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