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업 연구소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 한국 경제의 심장으로 기능했던 기업 연구소는 이제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의 IBM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연구소 재건을 통해 다시금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기업들도 참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성공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력과 리더십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이 배경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정책 변화가 있었다. NASA는 냉전 시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직접 우주 탐사를 수행했으나, 21세기 들어서는 전략을 전환하여 민간 기업과의 협력에 나섰다. NASA는 스페이스X와 같은 신생 기업에 우주선 운송 임무를 맡기고, 초기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성과 기반 계약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유도했다. 이러한 방식은 민간 기업이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
NASA는 과거 우주왕복선 운영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는 스페이스X와 같은 혁신적인 기업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갑’의 위치에서 파트너로 전환하자 민간 기업의 창의성과 혁신이 꽃피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스페이스X의 성공 사례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큰 교훈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민간 부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그 핵심이다.
미국의 국방 고등 연구 계획국(DARPA) 또한 기업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DARPA는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대학에 연구 과제를 맡겨왔다. 이러한 정책은 현대 문명을 혁신한 다양한 기술의 탄생에 기여했다. DARPA의 방식을 통해 기업 연구소는 기술 혁신의 선봉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IB미 왓슨 연구소와 AT&T 산하의 벨 연구소, 제너럴 일렉트릭 연구소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미국의 뉴저지주 뉴왁공항에서 만난 토머스 에디슨의 업적을 기리는 사진은 이러한 민간 연구소의 역사적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에디슨은 실패를 당연시하며 끊임없는 시도를 통해 혁신을 이끌어낸 인물이다. GE 연구소는 에디슨의 정신을 계승하여 다양한 혁신적인 발명품을 시장에 출시하며 인류에 큰 기여를 해왔다. 이러한 기업의 연구소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기업이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IBM의 연구원 역시 정부의 신뢰가 있었기에 대규모 국가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의 협력 관계는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시점이 온다. 그러므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만으로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IBM의 양자컴퓨터 프로젝트는 초기 정부 자금 지원을 받았으나, 기술이 성숙해짐에 따라 정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독자적인 길을 선택한 사례이다.
현재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단순히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국가 간의 총력전으로 변모하고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과거의 R&D 구조로는 생존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이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기업의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인재를 국가적 자산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큰 손실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치는 ‘원팀 전략’을 통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한국의 R&D 투자 규모는 세계 최상위 수준이지만, 절대적인 투자액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부족한 현실에서 민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혁신의 심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61068?sid=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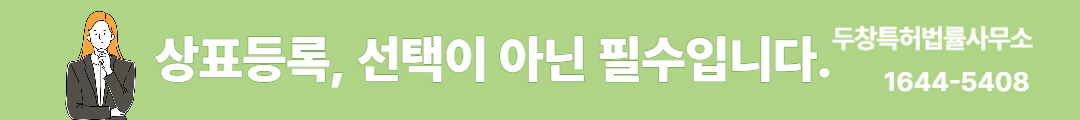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