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2035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을 앞두고, 산업 부문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냉매 사용의 감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냉매는 에어컨과 냉장고는 물론, 데이터센터와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다. 하지만 이 냉매의 주성분인 수소불화탄소(HFCs)는 그 지구온난화지수가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2400배나 높아 기후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냉동공조기기 생산국으로, 전체 냉매 제품의 95% 이상이 여전히 HFC 계열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HFCs의 사용 증가가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사실이다. 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에서 HFCs의 배출량은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는 통계는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별 전환 계획을 발표했지만, 기기에 주입된 냉매는 최대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범철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현재 냉매 배출에 대한 관리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부 간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우려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주기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내 냉매 회수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센터의 냉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량의 30~50%가 냉매와 관련되어 있으며, 최근 AI 산업의 발전으로 데이터센터의 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냉매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전환 수단으로 평가받는 기술마저 냉매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냉매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이미 2006년부터 불소계 온실가스 규제를 도입해 누출 방지 교육과 인증제도를 마련했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2018년과 2021년에 키갈리 개정서를 비준한 반면, 한국은 2023년에서야 OECD 회원국 중 36위로 비준에 참여했다. 이는 한국의 냉매 문제 대응이 국제사회에 비해 뒤처져 있음을 시사한다.
산업계에서도 대체 냉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후솔루션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가 HFC 감축 일정을 이해하고 있으며, 친환경 냉매로의 전환을 고려 중인 비율도 높았다. 그러나 응답자 4분의 3 이상이 전환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설비 개조와 대체 냉매 비용이 가장 큰 부담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 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한국에서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위주의 업계 구조를 고려할 때, 보조금과 세제 혜택, 품질 인증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2045년까지 HFCs 배출량을 2020~2022년 평균 대비 80% 감축해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체 냉매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냉매의 생산, 사용, 회수, 재활용, 폐기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73584?sid=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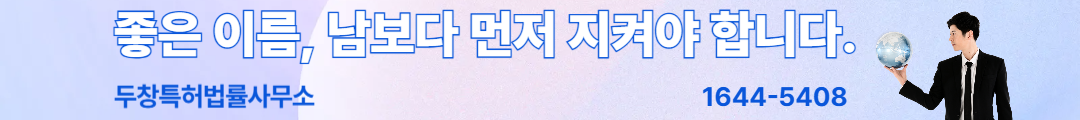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