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서울 RISE센터가 주최한 ‘제1회 산업계와 함께하는 대학교육 혁신포럼’에서 대학 창업교육의 현주소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제시됐다. 참석한 산업계 창업가와 전문가들은 현재 대학의 창업교육이 아이디어와 이론에 치우쳐 있으며,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호재 Y&ARCHER 대표는 전통적인 학생 중심의 창업 접근 방식이 시장 포화와 아이디어 중복이라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학이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과 교직원 연구 성과를 활용해 새로운 문제 정의를 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카이브를 통해 실패 사례집과 케이스 스터디를 교육 과정에 통합하고, 회계, 법무, 지배구조, 내부 통제 등 실무와 기업가정신 교육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기업가정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문제로 지적되며, 기업가 윤리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학생들이 투자 관련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대표는 “투자자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행력을 본다”라며, 학생들이 시장 검증과 투자 IR까지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예찬 스칼라데이터 창업자도 실제 투자 계약서 작성이나 고객 검증과 같은 과정을 경험할 기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론 중심의 SWOT 분석을 반복하기보다는 문제 해결과 매출 발생까지 직접 경험하는 모듈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별 창업 정책의 격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윤 창업자는 창업 휴학, 학점 인정, 지원 기금, 멘토링 등 각 대학마다 상이한 기준과 정책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는 창업자 간의 공평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창업센터의 운영 문제도 언급되었다. 매출이 낮은 초기 팀들이 공간 배정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대학 창업센터의 역할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최용석 중앙대 교수는 현장 실무 중심 교육이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기업 문제 해결 프로젝트형 과목과 현장 실습의 강화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역 창업 정책의 일관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글로컬대학과 RISE 등 정부 사업이 지역마다 상이한 정책으로 인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최 교수는 창업 경제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단일 행정구역의 경계를 초월해 창업 관련 자원과 인프라가 상호 연결된 경제적 협력체로 정의되었다.
마지막으로, 창업 실패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사회는 창업 실패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학생들이 도전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노성여 동명대 창업학과 교수는 실패를 성공을 위한 도전의 일부로 인식하는 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대학이 학생이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대학 창업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실무 중심 교육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기회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대학이 창업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351889?sid=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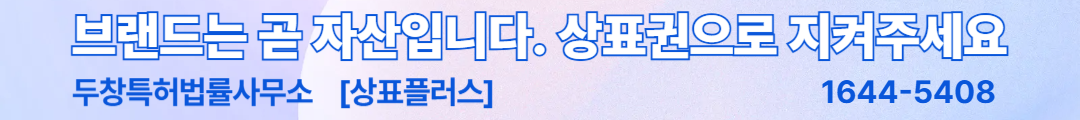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