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WEC) 간 체결된 원전 수출 협약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 1기 수출을 위해 2400억원의 기술료를 WEC에 지급하고, 9000억원 규모의 기자재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며, 수출 시장 또한 제한을 받게 된다. 더욱이 개발 중인 소형모듈원전은 WEC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 2015년에 이루어진 아랍에미리트(UAE) 수출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기술 자립을 주장하면서도 결국 WEC의 기술적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 논란의 본질은 단순히 기술적 측면이나 자재 구매 조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의 대미 외교력과 국제 원자력 질서 내에서의 구조적 한계가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다. 많은 비판이 WEC가 지적재산권을 문제 삼았다는 전제에서 시작되지만, 이를 보다 깊이 들여다보면 복잡한 외교적 맥락이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에 WEC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의 특허 보호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음을 감안할 때, WEC의 지재권 주장은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WEC가 제기한 소송의 주요 쟁점은 미국 수출통제법 위반이었으며, 한수원이 미 정부의 동의 없이 체코로 원전 수출을 추진했다는 주장이었다. 미국 법원은 이 소송을 기각했지만, 미국 정부는 WEC를 통한 수출 신청만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WEC의 권한을 인정한 셈이다.
원자력 수출은 군사적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수출 통제를 준수해야 하며, 기술 이전국의 동의 없이는 제3국에 수출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 이 점은 한국이 해외 기술을 도입하여 자체 모델을 개발했더라도 여전히 적용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겠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에 명시된 ‘양국 정부는 수출 통제에 협조한다’는 조항을 믿고 입찰에 나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세계 원전 시장이 부상하면서 WEC는 독점적 지위를 추구하며, 미국 정부는 원자력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종속적 파트너로 두기 위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 속에서 한국의 통상 외교력이 어떻게 시험대에 오르는지를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이 협약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것이다. 비록 불리한 조건이지만 WEC와의 협력은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원전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본질은 외교력과 전략적 대응력의 문제이며, 앞으로의 협상에서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한국 원자력 산업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협약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66602?sid=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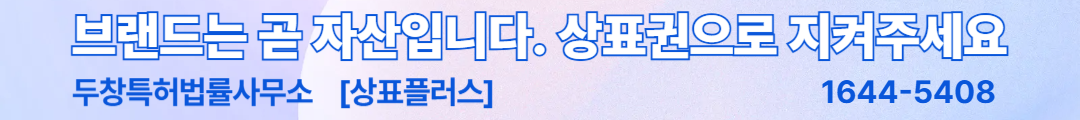
답글 남기기